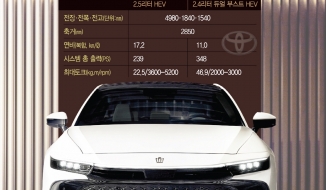|
어느 간호사의 특별한 경험을 들어보자. “암(癌)병동 간호사로 야간 근무할 때였다. 새벽 5시쯤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 벨이 울렸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다.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부리나케 병실로 달려갔다. 창문 쪽 침대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우리 병동에서 가장 오래 입원 중인 한 남자환자였다. ‘무슨 일 있으세요?’ 놀란 마음에 커튼을 열자 환자가 태연하게 사과를 내밀며 말했다. ‘간호사님, 나 이것 좀 깎아주세요’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맥이 풀렸다. 옆에선 그의 아내가 곤히 잠들어있었다.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잖아요?’ ‘그냥 좀 깎아줘요’ 다른 환자들이 깰까 봐 실랑이를 벌일 수도 없어 사과를 깎았다.
그는 사과 깎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번에는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 했다.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반으로 뚝 잘랐다. 그러자 예쁘게 좀 깎아달란다. 할 일도 많은데 별난 요구를 하는 환자가 못마땅해 못들은 척 하고 사과를 대충 잘라 줬다. 사과 모양새가 여전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를 뒤로하고 서둘러 병실을 나왔다. 그로부터 며칠 뒤 그는 상태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3일장을 치른 그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다. ‘사실 며칠 전 새벽에 사과 깎아 주셨을 때 저 깨어있었어요. 그날 아침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내밀더라고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그때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 손수 깎아줄 수가 없었어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님이 바쁜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누워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하고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정말 고마워요.’
이 말을 들은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나는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람 앞에서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가. 한 평 남직한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던 환자와 보호자, 그들의 고된 삶의 진실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그녀가 눈물 흘리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나게 해줘서 고마웠다고, 그것으로 충분했노라고.’ 가끔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 우리의 생각을 역지사지(易地思之)해보면 어떨까. 누군가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의 무지함을 깨우쳐주고 있다. 늘 내 생각이 먼저인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든다.”(‘가슴이 따스해지는 글’)
폴란드를 여행하던 스탄데일은 가이드에게 성당이나 박물관 구경은 그만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가이드의 안내로 병원을 찾아 환자들을 만났다. 그 가운데 58세가 된 올가는 지난 8년간 한 번도 그의 침대 밖으로 나오지 않은 환자였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이 죽은 후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았다. 한때 병원 의사였던 그녀는 8년 전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했고 열차는 그녀의 목숨 대신에 두 다리를 앗아갔다.
상실감으로 수많은 고통의 문을 지나온 여인 앞에서 스탄데일은 너무 맘이 아파 뭉툭하게 잘려진 그녀의 다리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 느낌을 말했다. 그를 보는 순간 부상당한 천사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천사는 그리스어로 앙겔로스(angelos)로 ‘사랑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라고 일러주며 천사는 하늘을 나는데 다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순간 올가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장 휠체어를 갖다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8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침대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는 사랑받고 싶은 사람, 이해받고 싶은 사람, 도움 받고 싶은 사람이 곳곳에 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더 열어주자. 우리의 서있는 위치를 조금만 더 낮게,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취해보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한 푼만 도와줍쇼”라고 요청하는 장애인을 앞에 놓고 더불어 주목해 바라봤다. 그리고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해결해줬다. 우리도 주변을 좀 더 자세히 바라보며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