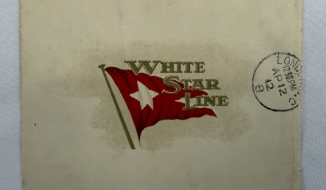늦어질수록 美협상력 약화 전망 속
가시적 결과없어 불확실성 목소리도
"정책당국 선제적 부양 조치 중요"
|
반면 우리 측의 우려만 전달했을 뿐 가시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협의로 일단 두 달 이상의 시간을 벌었지만 이미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대한 25% 품목 관세에 더해 10%의 기본 관세(보편관세)가 발효된 상황에서 25%의 상호관세 부과 여부는 계속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기 때문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7월까지 상호관세 부과 여부 결정이 안 되면 기업들은 생산기지 건설·인수합병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다"며 "결국 신규 투자는 위축되고 고용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부담은 경기 침체에 허덕이는 우리 경제에도 큰 악재다. 한국 경제의 양대 축인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고 최근에는 수출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0.2%)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종전(2.0%)의 반토막 수준인 1.0%로 전망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락 폭은 주요국 중 멕시코(1.7%p)와 태국(1.1%p)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이코노믹스(0.7%), 캐피탈 이코노믹스(0.9%), 씨티그룹(0.8%), ING그룹(0.8%), JP모건(0.7%) 등 주요 해외 투자은행(IB)은 한국 경제가 올해 1%도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상호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 중이지만 2분기 집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국내 성장률 수준을 고려하면 추경을 통한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상호관세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선제적이고 강력한 부양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도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성장 제고 효과가 기대보다 미흡하게 진행되거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된다면 0%대 경제성장률에 그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경제 성장에 있어 상방보다는 하방 리스크가 좀 더 큰 국면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완충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부양 조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