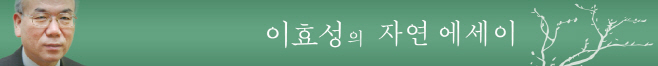|
5월 동안에는 나뭇잎들이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신록의 여리고 작은 연초록 잎들이어서 싱그럽기는 하지만 녹음이 짙다는 느낌은 주지 못한다. 그러나 6월이 가까워오면 나뭇잎들은 5월의 강한 햇살을 받아 진초록의 다부진 잎들로 변한 데다 클 대로 다 커서 이제 녹음이 짙다는 느낌을 준다. 말하자면 나뭇잎은 다 크고 튼튼한 잎들로 짙은 녹음을 이루고 풀잎은 땅을 가득 메운 채 짙은 향기를 풍긴다. 그리하여 5월 하순경부터는 전국의 산하가 이름 그대로 온통 짙푸른 녹음방초로 뒤덮인 계절이 되는 것이다. 이런 녹음방초의 천하가 여름 내내 지속되다가 가을이 되어 대기가 건조해지고 온도가 낮아져 잎이 마르고 변색이 일어날 때에서야 끝난다. 그래서 녹음방초는 여름철의 자연경관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이때부터는 꽃은 아무리 화려하게 피어도 초봄과는 달리 돋보이지 않는다. 이제 돋보이는 것은 다 자라서 땅과 하늘을 뒤덮어버린 진초록의 다부진 잎들이다. ‘꽃 심은 이는 꽃만 볼 줄 알고 / 꽃 진 후 잎 또한 화사함은 보지 못한다(種花人只解看花 不解花衰葉更奢)’ [〈池閣絶句〉 중에서]는 정약용의 시구가 암시하는 것처럼, 어느덧 꽃보다 잎이 돋보이는 세상이 온 것이다. 그래서 이때를 ‘녹음방초승화시(綠陰芳草勝花時·녹음방초가 꽃보다 더 나은 시절)’라고 부른다. 인생의 무상함을 춘하추동의 경물에 비유한 판소리 단가인 〈사철가〉는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방초승화시라’라고 노래한다.
|
그런데 상당한 규모로 누런빛을 띠어 이런 진초록의 녹음방초를 무색게 하는 초목이 있다. 바로 보리와 밀 그리고 대나무다. 보리와 밀은 5월 중순 어간부터 익기 시작하는데 그 이삭과 까끄라기가 먼저 누런빛을 띠기 시작하여 점점 그 줄기까지 누래져서 6월 초순에는 보릿대와 밀대 전체가 다 누렇게 변한다. 이때를 맥추(麥秋)라 부르는데 보리나 밀이 다 익어 씨앗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대나무의 어린 싹인 죽순은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까지의 어간에, 특히 비 온 뒤에, 많이 솟아오른다. 이때 상록수인 대나무의 잎들이 상당히 누렇게 변하는데 죽추(竹秋)라는 이 현상은 어미 대가 새로 나온 죽순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보리와 밀은 새로운 세대의 씨앗이 되기 위해, 대나무는 새로운 세대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초록빛을 잃는 것이다.
녹음방초의 초록은 생명의 상징이다. 잎들이 온통 녹색인 것은 자신의 개체를 성장·유지시키고 씨앗을 품은 열매를 키워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 광합성을 수행할 잎파랑이라는 색소를 만들어낸 때문이다. 그러나 잎파랑이를 버리고 누렇게 변한 보리와 밀, 그리고 대나무 역시 종족의 유지를 위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녹음방초 속에서 초록을 유지하는 일도, 그리고 그 초록을 버리는 일도 종족의 유지를 위한 하나의 자연스러운 생명 활동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