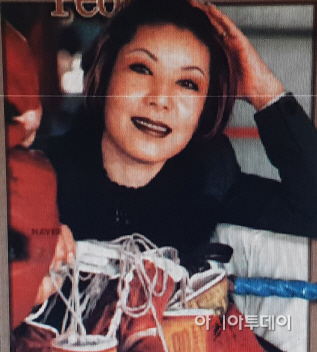|
1979년 복싱에 입문한 문성길은 선수 초창기 육상과 기계체조 등으로 단련된 하드웨어에 비해 스피드와 순발력 유연성 등 소프트웨어가 다소 부족했다. 고교 3년 동안 7차례 전국대회에 출전해 6개의 동메달에 그쳤다. 이 때문에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한국체대행이 불발되고 목포대에 진학했다.
1982년 7월 아시안게임 3차 선발전에서 문성길은 월드컵 은메달리스트인 장임석을 무너뜨리고 우승하며 그의 시대가 도래함을 알린다. 이후 1986년 아마추어 무대를 떠날 때까지 허영모와 3연전을 비롯해 5년 동안 단 한차례도 패한 적 없었다. 또 전 세계를 대표하는 3S(Speed, Skill, Strategy)를 갖춘 정상급 복서들이 문성길의 돌주먹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문성길은 국내외 아마복싱계를 평정한 복싱계에 징기스칸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의 복싱역사에서 천려일실(千慮一失)로 기억되는 것은 1984년 LA 올림픽 8강전이다. 당시 문성길은 이 경기에서 놀라스코(도미니카)에게 눈부상으로 좌절의 쓴맛을 맛보며 그랜드슬램(올림픽·월드컵·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 달성에 실패했다. 미국인 복싱코치 ‘히키’는 무쇠팔 무쇠다리 로케트주먹으로 무장한 문성길이 16강전에서 자국의 복서인 로버트 샤논을 3회 활화산처럼 터지는 강타를 뿜어내며 인상적인 RSC승을 거두자 ‘복싱 로보트’라고 호칭하며 문성길에게 최대의 찬사를 보냈다. 샤논은 1979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벌어진 세계청소년대회에서 한국의 홍동식을 꺾고 라이트 플라이급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도 선발된 미국의 간판복서였다.
|
당시 문성길은 집요하게 ‘타도 문성길’을 외치며 설욕을 다지는 허영모(한국체대)가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니었다. 특히 문화체육관에서 벌어진 두 선수 간 2차전에서는 아마복싱사상 최초로 암표상까지 등장할 정도로 빅카드였다. 당시 일반석은 1500원, 링사이드 관람석은 3000원이었지만 당일 오전 10시에 예매를 시작하자 1700여장이 삽시간에 매진되는 진풍경이 일어날 정도로 복싱 열기는 뜨거웠다.
알리와 프레이져의 3연전에 비유됐던 이들의 3차례 대결은 모두 문성길이 승리했다. 1·2차전 용호상박(龍虎相搏)의 혈투가 펼쳐졌으나 3차전은 문성길이 주도권을 잡았다. 문성길은 이 경기에서 한차례 다운을 곁들이며 5-0 판정승으로 이겼다. 사실 허영모는 대단한 복서였다. 서강일, 홍수환으로 이어지는 테크니션 계보의 한축을 차지할 만큼 수준 높은 기량을 보유한 복서다. 문성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뒤지는 체력을 제외하면 기계적으로 뿜어나오는 스트레이트 연타는 절로 탄성이 나올 정도였다.
|
문성길을 마주한 심영자 회장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3000만원의 수표를 내놨다. 1차 계약금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표 3장은 신의한수였다. 당시 문성길은 결혼을 앞두고 있어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날 가벼운 마음으로 가졌던 심 회장의 조우에서 놀라운 제안을 받은 문성길은 곧장 프로 전향을 결심했다. 이후 조건도 파격적이었다. 1987년 3월 프로데뷔전이 잡히자 방송중계료로만 IBF 챔피언 수준인 5000만원이 88프로모션에 지급됐고 문성길 파이트머니도 500만원이 책정됐다. 심 회장과의 만남이 문성길 복싱인생의 물줄기를 돌리는 전환점이 된 셈이다.
(문성길 복싱클럽 관장·서울복싱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