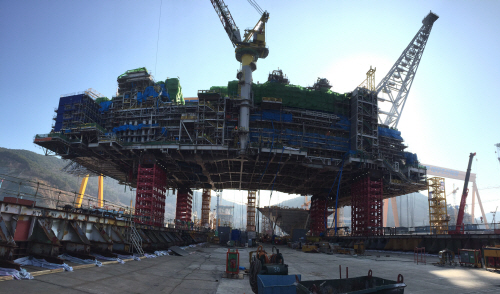|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빅3 조선업체는 하반기에 임원 축소와 부서 통폐합, 비핵심 자산 매각, 신규 투자 중지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들은 노조를 의식해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희망퇴직 방식의 일반 직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원대의 부실을 털어낸 후 인력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을 거쳤다. 지난해 임원수의 31%를 감축한 데 이어 올초에는 과장급 이상 사무직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해 13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그 결과 2분기 기준 손실이 1710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3분기 이후에는 흑자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인력 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상황은 다르다.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조 단위의 막대한 손실을 내고도 아직 대대적인 인력 감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000명을 목표로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연말까지 5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그럼에도 올 상반기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인 1조548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추가적인 인력 감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원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까지 해양플랜트 부문의 부실을 반영하지 않다가 올해 뇌관이 터진 대우조선의 경우 2분기 영업손실 3조318억원으로 3사 중 부실 규모가 가장 크다. 또 다수의 해양프로젝트에서 추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3~4분기 실적 전환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들 업체는 ‘인력 감축’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가뜩이나 노사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회사가 인력 감축을 주도할 경우 비난의 화살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 3사는 모두 올해 임금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 동결’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부실의 책임이 없는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 노사는 지난해까지 24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세울 정도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올 들어 부분파업이 벌어지는 등 삐걱거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 사가 노조와의 관계를 의식해 인력 감축과 관련된 부분은 쉬쉬하는 분위기”라며 “손실 규모가 워낙 큰 데다 하반기에도 업황이 여전히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