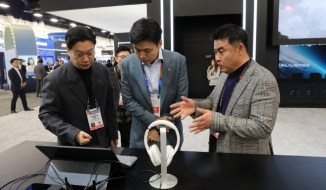|
2009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성한 선박펀드는 저가 매입과 고금리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2013년에는 선박금융 및 해양플랜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나 주로 해외 선사에 지원이 쏠려 정작 국내 해운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이다.
올해 선박펀드 지원에 내건 조건도 마찬가지다.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해운사들은 자연스럽게 핵심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했고, 업계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일찍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추후 성장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전례도 있다. IMF가 몰아쳤던 2002년 현대상선은 자동차선(현 유코카캐리어스)을 스웨덴 발레니우스(Wallenius)에 15억 달러에 매각했다. 부채비율 200%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유코카캐리어스는 지난해 기준 2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물론 자산을 모두 껴안고서 경영정상화를 실현하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있다. 다만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를 감행한 만큼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정상화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박펀드 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다. 해운사들은 선박펀드 지원을 받으면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을 발주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주문해 보유하기까지는 약 2년의 시간이 걸려 그간의 공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선박펀드와 얼라이언스 가입 지원 외에 더 구체적인 방안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현 해운업계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불경기가 초래했지만 그동안 정부가 비효율적인 대책으로 상황을 연명해왔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각 해운사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 기업을 돕고 있다’는 따가운 여론을 인식해 악순환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번 만큼은 정부가 칼을 든 만큼 책임 있게 경영정상화를 주도해 조건을 맞춘 해운사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