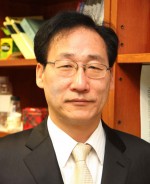 |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갑질'을 없애려는 강력한 흐름이 있다. 만약 어떤 회사 사장이 자신의 직원들을 자신과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적 주체로 보지 않고 마치 과거 신분사회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인 양 착각하고 행동한다면 곧바로 '갑질'을 했다고 질타당할 것이다. '갑질'을 타기시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속에는 그런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생각이 깔려 있다.
가상적 예를 들어보자. 변호사 리카도가 메리보다 타이핑을 훨씬 더 잘하지만 메리를 타이피스트로 고용한다. 리카도가 직접 타이핑을 하면 그 시간 동안 변론을 할 수 없어 직접 타이핑을 해서 절약한 돈에 비해 훨씬 큰돈을 벌 기회를 잃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메리는 리카도보다 변론은 물론 타이핑도 못해도 자유로운 시장에서 당당한 자유와 책임의 주체인 개인으로서 리카도와 호혜관계의 계약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 혹시 변호사 리카도가 메리를 노예처럼 취급한다면 이는 갑질로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렇지만 그게 소위 '을질'로 변질되는 순간 잘못된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 을질이란 사회적 약자인 을을 빙자해서 계약과 법을 넘어서려는 완장질을 말한다. 그런 을질은 불필요하게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우리 사회를 일종의 떼법이 횡행하는 사회로 타락시킬 위험이 다분하다. 갑을관계라는 용어는 ('사회적 약자'를 을로 치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때 우리 사회에 유행한 '사회적 약자'라는 용어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상적으로 맺을 수 있는 계약조차 제약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예컨대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대형마트나 SSM에 대비해서 사회적 약자로 보고 대형마트가 취급할 수 있는 영업품목에 제한을 가하고자 했던 게 그런 사례다. 흥미롭게도 이런 영업품목 제한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업인들이 "사회적 약자의 한 쪽인 농어민과 중소기업을 죽여 전통시장을 살리려 한다고 거칠게 항의를 했다. 그러자 영업품목 규제를 하려던 서울시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다. 사회적 약자인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의 시책이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농·어업인들을 생존의 위협에 빠트리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권혁철, 사회적 약자는 누구인가)
애덤 스미스는 정의(justice)와 자비(beneficence)를 대비하면서 사회를 건축물에 비유해서 정의는 그 건축물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면 자비는 그 건축물을 보기 좋게 만드는 장식품이라고 했다. 그래서 건물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비가 부족하면 그 건축물이 별로 아름답지 않겠지만 정의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무너진다고 했다. 그가 말한 '정의'는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 본래의 정의 개념인 '법의 지배' 개념이다.
아마도 그는 사회적 약자나 갑질 논란을 들었다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자비의 문제가 정의의 문제를 침해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라고 했을 것이다. 아마도 정부보다는 민간의 시혜가 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했을 것이다. 만약 정부가 만약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자 한다면, 그는 정부가 '정의'라는 사회 작동의 기둥에 손상을 입히지 말고 개인들이 경제활동을 마음껏 펼치게 하고 그 결과 더 많아진 세금으로 소득이 너무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했을 것이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유죄선고를 두고 일부에서는 사회적 강자에게 유죄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정의롭다는 식의 평가를 했다. 애덤 스미스가 이 말을 들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의와 자비를 대혼동한 것이라고 나무랐을 것이다. 판결이 정의로운지의 여부는 피의자가 사회적 강자냐 약자인가와 무관해야 하며 오로지 범죄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