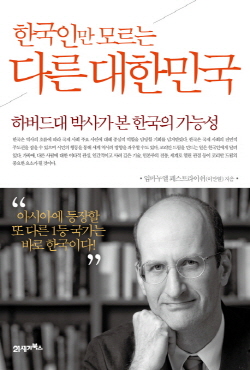| 이만열 | 0 |
|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한국이름 이만열)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는 한국 전통을 다시 보는 '온고지신'에 한국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송의주 기자 |
한국 이름 ‘이만열’로 더 잘알려진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51)는 최근 그야말로 ‘핫한’ 인물이 됐다. 지난달 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여름휴가기간 읽었던 책으로 그의 저서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21세기북스)을 소개한 덕분이다. 2013년 출간된 이 책은 이른바 ‘대통령 로또'를 맞아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이 책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한국의 여러 우수성과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를 잘 성숙시킬 경우 “아시아에 등장할 또다른 1등 국가는 바로 한국"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선비정신’을 좇아 다산 정약용과 연암 박지원을 좋아한다는 그를 안국동 카페에서 만났다. 인터뷰 내내 그가 방점을 찍은 것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이었다. 건조한 질문에도 그가 내놓는 답은 윤기가 흘렀다. 한국말 실력은 한국인 못지 않았다.
◇ 한국문화 외국인도 공감할 때 ‘세계화’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요즘 강연으로, 저술로, 인터뷰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다 대통령의 책 언급 때문이다. 어떤 점이 대통령의 소개를 이끌어냈을까? 그는 과거에서 미래를 발견할 수 있는 ‘온고지신’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앞세웠지만 알맹이가 뭐냐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고, 어떤 의미에서 책에 담긴 온고지신이 창조경제의 알맹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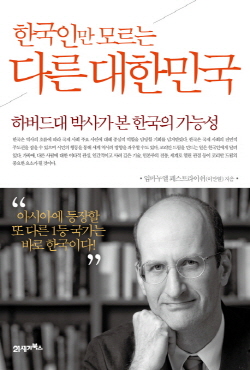 | 이만열 | 0 |
| 대통령 소개로 베스트셀러에 오른 페스트라이쉬 교수의 저서. |
그렇다면 그는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그는 ‘한국이 기적같은 성장을 이뤘다’는 말이 갖는 함의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 말 자체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한국의 성장은 지난 500여년 이상의 우수한 행정 시스템과 다른 나라에서 찾기 힘든 교육제도 등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에서 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가령 ‘1954년 한국과 소말리아 GDP가 같았다’고 하는데 이런 단순비교는 위험해요. 한국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선진국이 됐다, 이 점만 강조하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한국은 50,60년대에 못사는 나라였지만 빵을 못 먹어도 기계공학 박사도 있었고, 500여년 역사의 우수한 행정 시스템도 지니고 있었어요. 그냥 문화도 없었고 낙후된 나라가 아니었다는 점이 소말리아와 다른 부분이죠. 단순 비교는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고도성장만 강조하면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또 하나. 다음 단계로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의 보편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역설했다. 해외에서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데 선비정신이나 사랑방·설날 등을 외국인들이 자기 문화처럼 느끼고 적극 참여케 하는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 문화 대신 미국 문화를 취하는 것이 국제화가 아니라는 쓴소리다. 아울러 ‘재미’만 앞세운 한국 문화의 소개 역시 외국인들이 이를 자기 문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그다지 긍정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이 가져가야할 전통으로 '선비정신'을 꼽았다. 유교사상을 오랫동안 연구했고, 1995년 한국에 와서 여러 한문소설과 글을 읽으면서 특히 다산 정약용과 연암 박지원에 상당히 공감했다는 그의 주문이다.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에는 독특하게 사회적인 책임감이 투철한 지식인이 많다고 느꼈단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선비정신'은 어떻게 구현돼야 할까?(그는 한 인터뷰에서 다산을 존경하는 이유로 “고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학을 가졌고 당시 서민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창안해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비정신을 한국만의 현상으로 가져가면 안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이상적인 신념으로 만들어야 해요. 조선시대 선비정신을 조악한 정의나 습관으로 국한할 게 아니라 아프리카나 남미 등에서도 자신들의 나라를 혁신할 수 있는 미래로 생각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는 선비정신이 역사 혹은 문학의 단순 연구 대상이 아니고 바람직한 현대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책임감 있는 지식인의 모습으로서 ‘선비’는 항상 사회를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활동이나 행위에서 높은 도덕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 무엇보다 검소하다. 특히 한국이 그렇다는데, 엄청난 석학들도 조그만 집에 살면서 적게 먹고 검소하게 살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히려 일제시대 교육 탓에 역사 속 이러한 검소한 생활이 낙후됐다고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는 그는 “그것이야말로 대단한 매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지나친 소비 문화, 낭비 문화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강남스타일' 같은 한류도 나름 재미있지만, 그런 것을 저는 특별히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 전통 문화에 더 매력을 느끼는 편이죠.”
그런 점에서 현재 케이팝이나 한류드라마엔 아쉬운 게 많다. 재벌 주인공, 엽기적인 내용들, 분명한 교훈 없는 구성 등이 그것이다. 좀더 윤리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점, 외국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한국의 전통의 재해석, 가령 신라시대 무늬의 활용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문했다.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미개발 문화 콘텐츠가 엄청나게 많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한류대체재로 고려시대 사찰 내부구조, 백제 문양, 한복의 아름다운 요소를 꼽은 바 있다.
◇ “온고지신, 옛 것에서 창조적인 것 발견”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미국 예일대에서 중국 고전을 전공하고, 일본 도쿄대에서 중국과 일본의 한시를 비교연구해 각각 중문학 학사와 비교문화학 석사를 받았다.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 언어문화학 박사 과정 중이던 1995년 서울대 대학원(중문과) 연구생 자격으로 오면서 한국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이때 박지원과 정약용의 글을 접하면서 한국 전통사상과 문학에 끌렸다고. 1997년 지인의 소개로 현재의 한국인 아내를 소개받아 결혼도 했다. 이때 장인어른이 그에게 ‘이만열'이란 한국이름도 지어줬다. 임마누엘이라 원래 성이 ‘임'이어야했음에도 불구, 아내 성을 따라 ‘이'로 결정했다며 그가 웃었다. “많을 ‘만’, 열정 ‘열’, 열정이 많다는 뜻이예요.”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동아시아 전공 교수로서 일리노이주립대학에서 8년 동안 재직했다. 인문학이 심심해졌고 동료 교수들과 사고방식도 맞지 않았던 그는 일리노이대 공대 교수들과 교류가 더 많았다.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공대 교수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다고. 그러면서 과학기술과 국제 관계, 외교까지 관심 분야를 확대했다.
2005년부터는 주미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 자문 역할도 했다. 그러다 2007년 충남지사 보좌관과 우송대 교수 겸임 자리를 소개 받고 가족과 함께 한국에 건너온다. 충남지사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투자유치나 관광, 공장 건립 참여, 외국 방문 등을 수행했다. “원래 전공과는 무관한 일을 하느라 곧 한계에 부딪혔다"고 그는 회상했다. 힘든 점이 많았고, 투자유치를 위해 하버드대 출신인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도 싫었다.
그러다 4년전부터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한국의 예전 전통이나 우수한 행정 습관, 건축기술 등의 재발견에 관심을 갖게됐다. ‘온고지신’, 이러한 옛 것을 보고 창조적인 것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됐다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그래서 의미가 큽니다. 오히려 지난 역사에서 한국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라와 고려, 조선시대의 행정 시스템이나 춘추관, 공동체 마을 의식, 한옥 등의 요소요소를 현대에 활용하게 되면 한국이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대학에서 수업만 하는 교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다. 사회와 일반인과 소통하는 현장의 교수에 매력을 느낀다고. 이를 그는 “선비정신의 일부"라고 말한다. 정약용의 경우, 석학이지만 농업정책이나 행정, 나아가 과학기술까지 성과가 많은 점을 예로 들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한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는 서양이나 중국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하기도 했다. “그런 지식인이 되고 싶었다"고 그는 기대를 나타냈다.
◇ 세계 석학과의 인터뷰 시리즈물로 계획
한국과 중국, 일본을 모두 안다는 것이 그의 장점이다. 세 나라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그는 중국이름도 있다. 貝一明(베이밍). 중국서 대학 다닐 때 지도교수가 지어준 이름이란다. 일본어 이름은 아직 없다고)
그가 생각하는 세 나라의 특징도 궁금했다. 중국은 말 그대로 ‘큰 나라'로, 여전히 자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고, 외국에도 많이 안 나간다고. 한국은 주변국가를 의식하면서도 지난 20년간 창의적인 새로운 문화를 많이 만들어낸 편. 한국 사람들은 자기 문화를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나마 최근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는 움직임들은 다행스럽다고. 반면 일본은 지난 몇년 동안 해외 교류가 그만큼 활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역사적으로도 순간순간만 문호를 개방했을 뿐 내향적 성격이 강한 쪽으로 진화를 해나가는 듯 하다고.
그는 또한 해외 석학과의 활발한 교류로도 유명하다.(그는 2012년 다산북스를 통해 ’세계의 석학들 한국의 미래를 말하다’를 내기도 했다) 그런 그에게 한국에 덜 알려져 있지만, 꼭 알려졌으면 하는 사람 소개를 부탁했다.
먼저 그는 하버드대 중국사 전공 교수인 후쿠아먀 교수를 꼽았다. 하버드대 학생한테 가장 인기있는 교수라는데, 지난해 ‘수업 제일 잘하는 교수 5명'에 뽑히기도 했다고. 마이클 푸엣 교수 역시 하버드대 중국사 교수다. 소통을 잘하는 교수라는 게 그의 평가다. 중국 고대를 전공했으면서 현대 학부생과의 대화에도 능통하다고. 그는 지난 2012년 하버드대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보다 많은 수강생을 확보한 인문학 강의(‘고전 중국 윤리·정치 사상’)로도 유명세를 탄 바 있다. 스스로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으로 '논어(Analects of Confucius)'를 꼽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의 벤자민 엘먼 교수 역시 중국통이다. 그는 현대 한중일 관계에 관심이 많은 학자로, 현상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잘 설명한다고. 무역의 경우, 15세기 무역 시스템부터 지금의 자유무역을 관통하면서 상호 비교해 풀어주곤 한다.
지난 8월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아시아투데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이날 그는 “아시아투데이의 글로벌화 전략에 힘이 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 아시아투데이 고문 위촉) 약속대로 그는 세계 석학들과의 인터뷰를 기획했다.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과 중국 석학들과의 직접 인터뷰에 나선다. 이미 마이클 푸엣을 포함해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의 저자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역사의 종말' 저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 '일등 국가 일본: 미국을 위한 교훈'을 쓴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교수,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청소년과의 대화 역시 그가 생각하는 중요한 협업 중 하나다. 미래 준비의 일환으로 한국·중국·미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많이 마련할 계획이다. 각국 청소년들이 자국의 콘텐츠를 공유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정보 매개물로도 선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이는 그가 소장으로 있는 ‘아시아 인스티튜트’에서 지난 8년간 해온 일이기도 하다.
 | 이만열 | 0 |
| '한국사람보다 더 한국말을 잘하는' 페스트라이쉬 교수와의 인터뷰 내내 시종 유쾌했다. /사진=송의주 기자 |
어릴 때 어려운 책 읽기를 권하는 할머니 영향을 크게 받으며 성장했다는 그는 7살 때 소설이나 시를 쓰기도 했고 건축이 하고 싶어 취미로 건축 그림도 많이 그렸단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6개 언어 구사가 가능한 그는 역설적으로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알고, 새로운 문화를 기초부터 만들 수 있는 지 고민하는 게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릅니다. 지금 교육제도는 효과가 없어요. 10년, 20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정보는 누구나 받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판단력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세계의 석학들 한국의 미래를 말하다' 외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하버드 박사의 한국표류기’(노마드북스), ‘연암 박지원의 단편소설’(서울대출판사), ‘중일 고전소설의 세속성 비교관찰’(서울대출판사) 등의 책을 펴냈다. 허생전·양반전 등 연암 박지원의 소설 10권 전권을 영어로 번역한 건 유명하다.
현재 그는 ‘바다 넘어 진실을 추구한다’의 소량 한국 출판에 이어 중국 출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초엔 ‘한국인만 모르는 또다른 서울 이야기'를 출간할 예정이다. 서울의 문화 등을 소개하는 책이 될 것이란 귀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