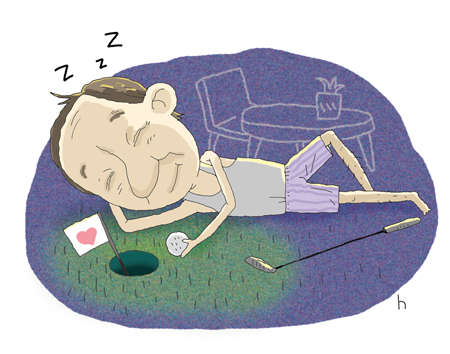 |
골프도 마찬가지다. 다 아는 얘기지만 힘이 들어간 순간, 골프도 춤도 망친다. 진정한 춤꾼은 미스코리아 빰치는 미인과 손을 잡아도 아랫도리에 반응이 없어야 한다고 한다. 구멍만 보면 덤벼드는 골퍼들이 있는데 이 껄떡거림부터 고쳐야 스코어가 는다.
혹자는 말한다. 주인 있는 구멍도 넣는 판인데 주인 없는 구멍이야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간 큰 코 다치는 게 골프다. 구멍과 친해지는 방법은 연습밖에 없다. 퍼팅이야 어디서고 할 수 있다. 사무실도 좋고, 거실도 좋다. 동선만 확보되면 가능하다.
골프에 한번 미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내기골프에서 한번 터지고 나면 더 미친다. 사실 필드에서 터지고 미치는 것보단 연습하고 미치는 편이 훨씬 낫다.
한번 ‘맛’이 가면 새벽에 화장실 다녀오다 팬티바람으로 퍼팅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어떤 흔들림을 느꼈다면 하체가 움직였다는 증거다. 퍼팅이 안 되는 골퍼는 헐렁한 사각팬티만 입고 쳐보면 답이 나온다. 아예 팬티마저 벗고 치면 더 확실하다.
구멍과 친해지는 방법 또 한 가지. 볼이 그린에서 1m정도 벗어났다면 무조건 퍼터를 든다. 아직 보기플레이도 못하는 골퍼라면 더욱 그렇다. 피칭이나 샌드웨지로 볼을 띄워 멋지게 홀에 붙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이런 꿈은 깨는 게 좋다. 그린 에이프런이나 프린지에서 퍼터를 든다고 ‘쪽’팔릴게 하나도 없다. 터지는 것보다 낫다.
또 다른 팁. 퍼팅은 세컨샷부터 시작된다. 보통 파온을 시키면 누구나 퍼터를 빼들고 그린으로 걸어간다. 하지만 여기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난다. 그린의 전체적인 윤곽은 바로 세컨샷 지점부터 나온다. 코스 설계상 보통 그린은 앞쪽보다 뒤가 더 높다. 때문에 세컨샷지점부터 걸어가며 그린을 읽는 게 좋다.
마지막은 잔디를 깍는 기계(그린모아)의 진행방향에 따라 결이 달라진다는 것. 그린모아의 폭은 보통 22~26인치다. 잔디가 순결이냐 역결이냐를 따지는 방향이 22~26인치라는 얘기다.
구멍과 친해지기 위해선 무턱대고 덤비지 말고 자세히 살피는 게 먼저다.














